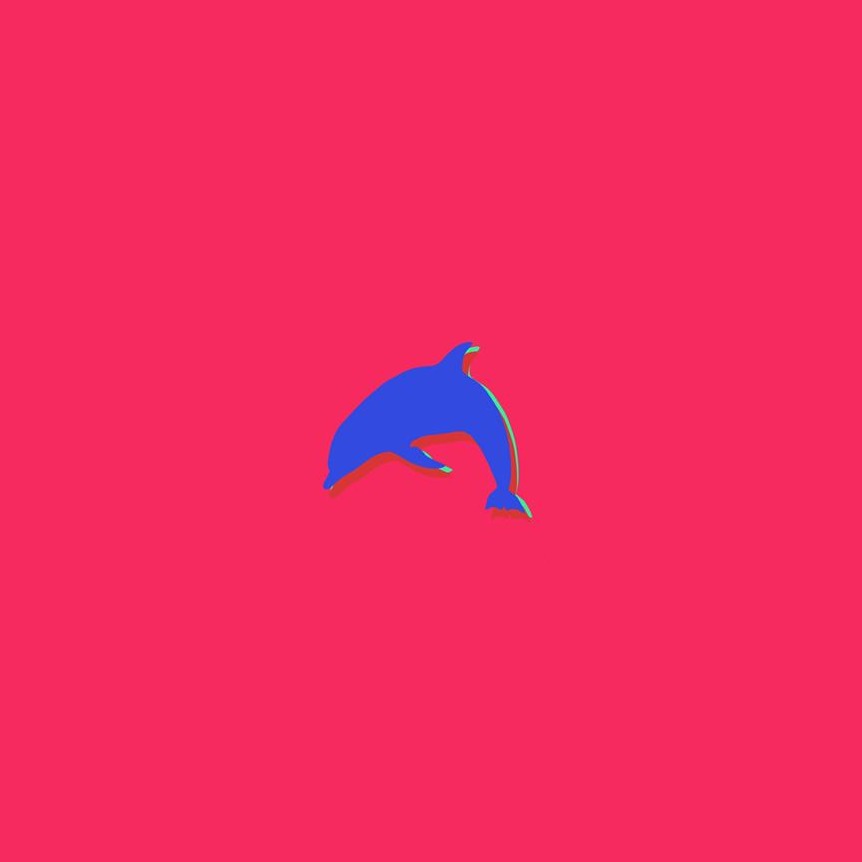Que Sera Sera
영화 기생충 봉준호 감독 통역사 최성재(샤론 최) - 빙의하기의 타고남 본문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 옆에서 따라다니며 찰떡같이 통역을 해 주는 최성재(샤론 최) 통역사가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분이 화제가 된 지는 이미 조금 지났기도 하고 이 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많이 나와 있어 포스팅을 하지 않으려다가 대한민국 통역사의 시대를 여신 1호 통역사인 한국외대 통번역대학교 명예교수 곽중철 교수님께서 쓰신 칼럼을 보고 갑자기 필(?)을 받아 글을 씁니다.
통역사 최성재씨에 대한 정보가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에 거주 중이고 미국 대학을 나왔다는 것, 그리고 본인이 직접 단편영화를 찍기도 한, 본업이 영화 감독이라는 것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통역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데, 들어보면 너무나 처음이 아닌 실력이라서 경험이 있었겠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도 영어를 할 수 있을텐데 왜 통역사를 구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이 현직 통역사들의 고민이자 발전하게 되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통역사들은 어딘가에서 한계를 느낄 때가 종종 있는데요, 바로 특정 분야에만 집중된 통역을 오랫동안 할 때입니다. 하루의 통역을 위해 여러 날을 공부하고 서치하다보면 그냥 내 옆에 그 분야의 전공자 한 명이 요정처럼 달라붙어 귓속말로 전문용어와 그 분야에서만 쓰는 줄임말이나 속어를 줄줄 읊어주면 안되나 하는 간절함이 생깁니다(저만 그런가요).
전문 통역사들은 대부분 자신의 전공 한 개(대체로 인문학이나 언어학 쪽, 잘해야 사회과학 쪽)와 언어 두세개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통역 교육을 받습니다. 하지만 통역대학원을 마치고 나와도 전공지식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하며 지식을 쌓아가고, 또 통역을 앞두고 있을때 해당 업계의 지식을 벼락치기로 열심히 공부하는 식입니다.
가장 좋은건 자기 전공 분야 또는 자기 스스로가 해당 분야에 몸담고 있으면서 통역을 맡아 하는 것이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본인이 하지 않고 전문 통역사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봉준호 감독이 같은 업계에 있는 영화감독이면서 통역 경력이 있는 샤론 최씨를 통역사로 고용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동시에 전업 통역사들이 각성해야 할 상황이기도 합니다.
샤론 최(최성재)씨의 통역이 어떻길래 다들 난리일까요?
아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인터넷에서 떠도는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스토리를 모르고 가서 봐야 재밌거든요."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순간 자기도 모르게 "스토리"와 "재미" 라는 단어에 꽂혀서 it must be more interesting~ 으로 시작해서 뒤에 어떻게든 story 라는 단어를 넣기 쉽습니다.
그런데 최 통역사는 because the film is the best when you go into it cold 라고 표현했습니다. "cold" 라는 표현은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어떤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게다가 "go into it" 이라고 했으니, "아무 준비 없이 영화 속으로 딱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 영화를 최고로 잘 감상할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딱 와 닿습니다. 봉 감독의 말이 끝나 통역을 시작해야 하는 그 순간, 1초 이내의 사이에 찰떡같은 구어체 표현을 골라 말한 겁니다.
이게 바로 통역 업계에서 말하는 "빙의된" 통역사의 통역 결과물입니다. 최 통역사의 본업이 영화 감독이라서 업계의 이해도가 높아 가능했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초반부에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곽중철 명예교수님께서 쓰신 칼럼을 언급해드렸습니다. 해당 칼럼은 한겨례에서 발행되었고,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내외 영화인들이 구사하는 언어는 아무나 이해할 수 없고 특히 최고의 국제 영화 관계자들을 상대하며 같은 수준의 전문용어와 속어를 구사하는 봉 감독의 말을 통역하려면, 30년 가까이 연상인 그의 머릿속에 들어가거나 그의 이마 위에 앉아 있어야 한다. 최씨는 그렇게 통역을 했다.
(중략)
통역의 성패는 우선 말을 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 봉준호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고 통역의 어려움과 민감성을 알고 통역사를 배려하는 사람이다.
-칼럼 본문 중에서
통역이 잘 되려면 연사(말을 하는 사람) 역시 말을 잘 해주어야 합니다. 한국분들은 '그', '저', '부분', '~중에', '~것 같은데' 등의 표현을 써서 애매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문을 마구마구 집어넣어 동사가 대체 어느 주어에 걸리는지 알 수 없게 의식의 흐름대로 발언하거나 주어와 목적어를 모두 생략하고 아무렇게나(?)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지요. 그래서 통역사는 외국어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머리를 굴려 이해해서 머릿속에서 정리해(논리력) 외국어로 내뱉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곽 교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네요.
통역사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한국어로 명확하게 화자의 의도가 드러나도록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모두가 행복한(?) 통역 현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봉준호 감독님 아카데미 4관왕 달성하셨는데, 봉 감독님도 최 감독님 겸 통역사님도 배우님들도 모두 승승장구 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Connect BTS (커넥트 BTS) - 뉴욕 2/5 - 3/27 (5) | 2020.02.17 |
|---|---|
| 독일 오페라 욱일기 사용 논란 사태 정리 (6) | 2020.02.16 |
| 슈피겔 코로나 made in china (중국산 코로나) 해석 독일 반응 (2) | 2020.02.03 |
| 독일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3차 감염 발생 - 7번째 확진자 발표 (2) | 2020.02.01 |
| 독일 우한 폐렴 2차 감염 발생 - 감염자 지도 제공 (4) | 2020.01.30 |